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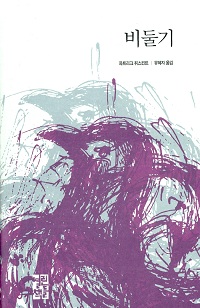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공포는 삶의 원동력이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비둘기는 바로 공포와 삶을 위한 헌사다.
주인공 노엘은 30년 넘게 기계적이고 예민한 삶을 반복해왔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씻고 나서 8시 15분까지 출근한다. 근무 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로 경비원 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물론 일하는 동안 은행지점장 뢰델 씨에게 인사하는 것을 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단조로운 삶이야말로 그에겐 실로 소중했다. 노엘의 삶의 목표는 건조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것과 그의 작은 집을 갖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강박적으로 자신에게 익명성을 부여한다. 누구도 노엘이라는 특별한 인간 하나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노엘의 생각에 따르면, 그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 로카르 부인의 아파트에 사는 남자, 파리 은행의 경비원으로 기억돼야 한다. 누군가 그를 알게 되면 그의 작고 행복한 일상을 성가시게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노엘의 소소한 삶에 비둘기 한 마리가 침입한다.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어떤 맥락도 이유도 없이 비둘기는 그의 집에 들어와 있다. 노엘은 주포비아(zoophobia: 동물을 두려워하는 공포증)라고 할 만큼 병적으로 비둘기가 무섭다. 곧, 그의 지나친 불안은 정상적으로 수행됐어야 할 일들을 놓치게 한다. 삶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은 그에게 또 다른 불안함을 안긴다. 비둘기에게서 시작한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노엘은 심지어 뢰델 씨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의 하루가 송두리째 엎어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건은 구원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혼자만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엘의 의도치 않은 일탈은 그에게 새로운 만남과 생각을 준다. 특히, 비둘기 때문에 떠오르는 온갖 과대망상과 자살 충동에 가까운 불안은 쥐스킨트 특유의 집요한 서술 덕분에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다가간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불현듯 노엘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비둘기라는 공포를 대면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루한 삶에 대한 애착이 그를 결말로 이끌었던 것이다. 집에 다다랐을 때, 더는 집에 비둘기가 없었다. 결국, 노엘의 이상한 하루는 하루로 끝난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비극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지루한 삶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비둘기 사건으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건 그가 철저히 혼자라는 점이다. 그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라도 좋으니 그를 구해달라며 졸도하고 있을 때,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그의 잘못이다. 노엘은 익명으로 점철된 일상 동안 그를 도울법한 사람을 사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엘 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가 지독하게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분명 일반인보단 과하나 독자들이 그의 내면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더럽고 불결한 새라는 걸 인정한다. 꼿꼿이 서 있을 때 어느 다리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은 노엘만의 생각이 아니다. 독자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죽고 싶어도, 또는 죽이고 싶어도 감히 그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느 하루를 발견하게 된다. 반복되는 현실 속에 고립된 자아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현대인의 삶이다.
그렇다면 그가 일반인보다 유난히 병적이고, 극적이고, 예민하게 묘사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쥐스킨트 식 서술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보통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상기(reflect)해보자. 문장으로 정리된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때면 이따금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거나 전혀 상관없이 연계되곤 한다. 쥐스킨트는 바로 이 생각 사이의 틈새를 메꾼다. 즉, 문장으로 넘어가는 논리적 고리를 끈끈하게 다지거나 퍼뜩 떠오르는 생각에 앞뒤 흐름을 부여해 매끄럽게 묘사한다. 혹자가 쥐스킨트의 내면 묘사를 돋보기에 비유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띄엄띄엄 보이는 큰 생각들 사이를 크게 확대해서, 연쇄적인 생각들까지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이 보는 비둘기 속 노엘이라는 인간상은 쥐스킨트에 의해 극대화된, 왜곡된 일반인의 상이다. 노엘이 자기 자신을 익명 속에 두려고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익명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어느 누군가’를 지칭한다. 즉, 노엘은 불특정 다수를 대변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비둘기는 그들을 겨냥한 우화다.
세상에 제대로 된 명칭이 붙은 공포증(phobia)만 하더라도 500개가 넘는다. 노엘이 비둘기를 무서워하듯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쥐스킨트의 책을 덮고 나면 이런 궁금증이 든다. 과연 독자들의 ‘비둘기’는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의 일상을 깨뜨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루를 탈피할 것인지. 비둘기의 결말은 일상으로의 회귀였다. 독자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하루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책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비둘기야말로 독자들의 비둘기가 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