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
| ‘휴먼즈오브’와 ‘디아티스트 매거진’의 인터뷰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시작이 제일 힘들다고. 낯선 이가 말을 걸면 누구나 경계하기 마련이다. 거기에 녹음기와 카메라까지 들고 있다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친다. 지난 일주일 간 인사캠과 자과캠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거절도 많이 당했다. 그러나 가만히 자리를 내어주고, 카메라를 보고 웃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자랑, 뒷담, 격려, 호소….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았다. 길고도 짧은 10분, 귀찮음을 잠깐 숨겨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1. 방학 때 제주도를 갔다가 탄, 송아영(신방 12)
“토요일인데 학교는 왜 오셨어요?”
“학교 언론고시반 예필재에서 하는 특강 들으러 왔어요. tvN <더 지니어스> 담당 PD분이 강의했는데 재밌었어요. 이번 학기에 예필재 학생 모집하면 지원해보려고요. 성대신문도 2학년 때 들어가려 했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아, 저도 전공 수업에서 인터뷰해야 하는데 기자님 해도 될까요? 서로 돕고 살아요~”

2. 예쁜 것보다 멋있는 게 더 중요한, 송혜슬(건축 15)
“작년에 키우던 거북이가 죽었어요. 이름이 ‘돌쇠’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멜’이랑 돌쇠 두 마리를 데려 왔는데, 제가 가가멜을 훨씬 더 챙겼어요. 돌쇠는 자기 혼자 잘했으니까…. 하루는 학원 다녀와서 봤더니 눈이 쑥 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집 화단에 묻어 주면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3. 호날두를 좋아하지만 바르샤를 응원하는, 윤홍준(건축토목 14)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데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치는 곡은 뭐예요?”
“징글벨이요. 더 연습해서 쇼팽 같은 곡을 치는 게 꿈이에요. 멋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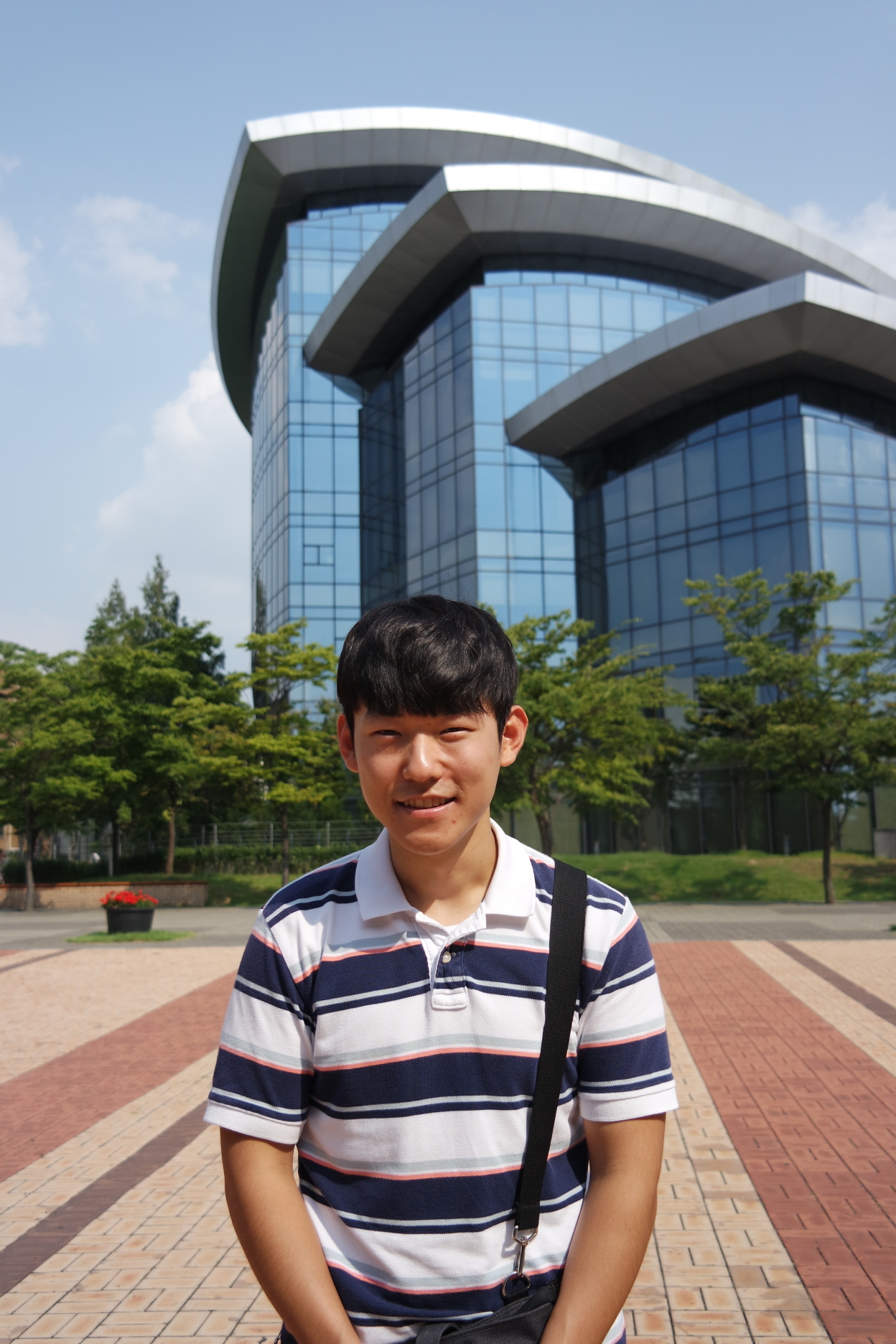
4. 여행을 갔더니 태풍이 따라온, 김원빈(수학 12)
“이번에 슈스케를 나가려고 했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한 3회 정도 보니까 안 나가길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잘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건 자기만족에 그칠래요.”

5. 저번 주 수요일에 한국에 온, Martin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좀 차갑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 편이죠. 근데 말을 걸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독일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자리를 뜰 때 옆 테이블의 사람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는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먹는 것이 신기했어요. 독일인은 같은 음식이어도 각자 시켜 따로 먹거든요.”

6. 인문관 옥상 원곡정원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던, 정우택(국문) 교수
“현대시 수업에서 필사 과제를 왜 내냐고? 시에는 세상이 담겨있어. 시를 베껴 쓰는 필사는 그 세상을 느끼기 위해 언어를 물질화 시키는 과정이야. 시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실 바깥에 있어. 그런데 다들 조금씩 불안해하고, 흔들리면서 바깥을 보기 두려워하지.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종교도 많아지고, 뒤죽박죽이 돼. 그게 실제로 우리 세상이야.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개인이 결단해야 해. 그러려면 부딪쳐보고 체험해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필사를 하는 거야. 학생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수업을 듣는 게요?”
“아니, 사는 게.”

7. 지하철을 탄 모두가 자신을 알았으면 하는, 김재남(반도체 14)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어졌다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랑 놀다가 친구 아버지랑 만나면 친구가 아버지한테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쓸쓸하고 마음 아팠었어요. 그 땐 아빠 사진 볼 때마다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체 왜 엄마 말 안 듣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랬는지….”


